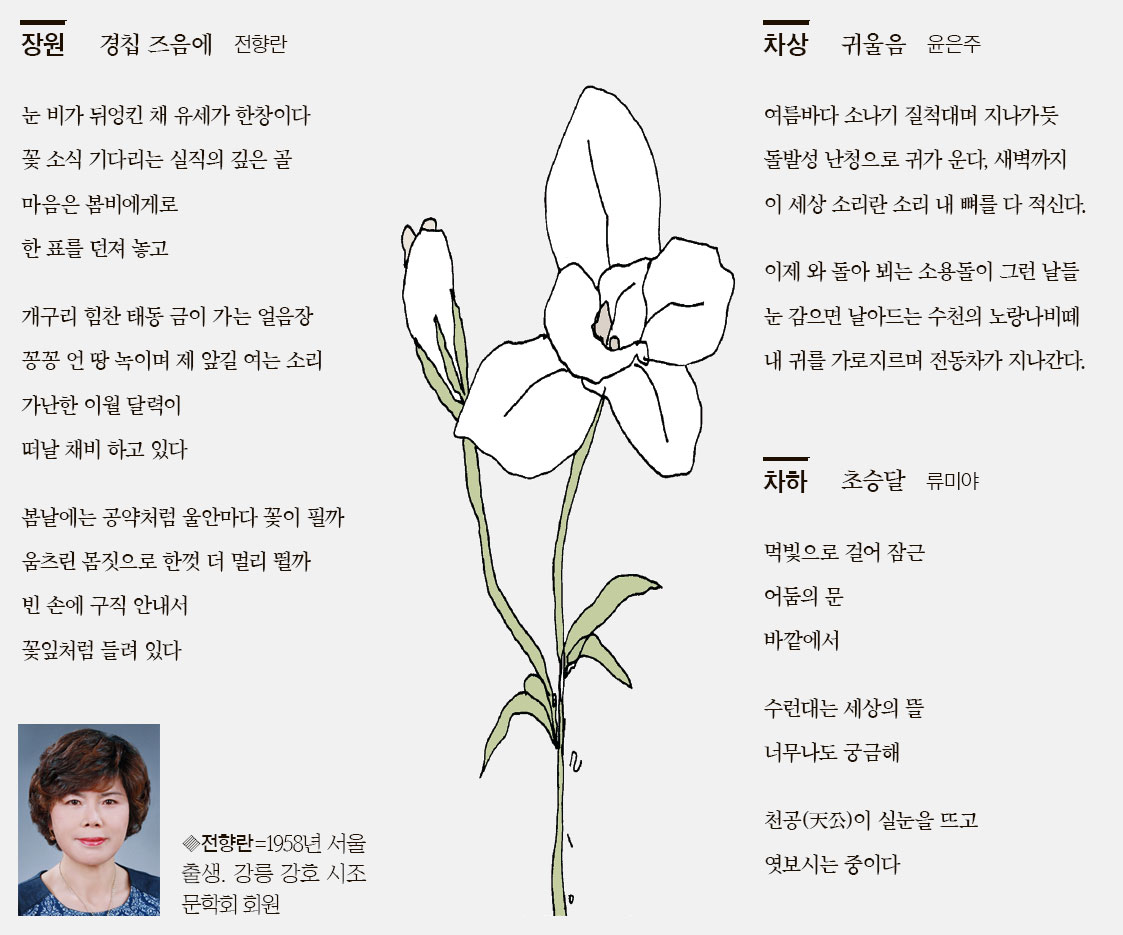
이 달의 심사평
부드럽게 흘러간 시상 … 종장 앉히는 솜씨도 일품
싱그러워야 할 봄날이 스산하게 지고 있다. 사방에 요란하게 흩날리던 현수막도 큰 바람 뒤에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바람이 바람을 재운다. 잔인한 4월. 세월호 대참사 앞에 죄인이 따로 없는 먹먹한 시간 속에서 응모작품들을 읽고 고르는 일도 마음 깊이 힘들기만 했다. 그 가운데 세 편을 뽑아 들었다.
전향란의 ‘경칩 즈음에’는 선거정국-경칩-실업-구직으로 이어지는 시상의 전개가 긴밀하면서도 시조의 품격을 한 단계 승화시킨 수작이다. 자칫 상투적인 구호로 그칠 수 있는 선거라는 소재를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들의 아우성으로 이었다가, 그 와중에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자의 꽃빛 설렘과 기대로 아우른 품이 단연 돋보인다. 세 수 모두 종장을 앉히는 솜씨도 뛰어나 장원으로 뽑기에 충분했다.
윤은주의 ‘귀 울음’은 돌발성 난청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운 통증이 고스란히 시화되어 있다. ‘이명(耳鳴)’은 어지럼증과 난청을 동반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여름바다 소나기 질척대며 지나가’는 듯도 하고, 급기야 ‘내 귀를 가로지르며 전동차가 지나’가는 듯도 한 것이다.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성찰도 행간에 녹아 있다. 혼자만의 고민, 혼자만의 통증을 잘 형상화했다.
류미야의 ‘초승달’은 단출하면서도 아담한 시다. 흡사 ‘하늘이/하도나/고요하시니//난초는/궁금해/꽃 피는 거라’ 했던 미당 서정주의 ‘난초’를 읽는 듯하다. 깜깜한 밤하늘에 실눈을 뜨고 세상을 훔쳐보는 초승달의 자태가 눈에 선연하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단시조로서의 완결미도 갖추고 있다.
이달에도 시조백일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투고작들이 몰려들어 설렘과 기대의 난장을 펼쳤다. 저마다 품과 격이 있고 독특한 소리와 울림과 향기가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은 반면에, 시조의 기본 율격조차 소화하지 못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선정작 외에 송이일·경대호·이종문·곽희연 씨의 작품이 최종적으로 거론됐다.
심사위원=오승철·박명숙(대표집필 오승철)
◆응모안내= 매달 20일 무렵까지 접수된 응모작을 심사해 그 달 말 발표합니다. 장원·차상·차하 당선자에게 중앙시조백일장 연말장원전 응모 자격을 줍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번지 중앙일보 편집국 문화부 중앙시조백일장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814)
초대시조
꿈꾸는 반도(半島) 박기섭

1
그냥 산이어선 안돼, 그냥 그런 산이어선
스스로 골짜기를 팬, 그런 속살의 아픔을 아는,
그 온갖 푸나무 자라고 새떼 깃드는 그런 산
마을과 마을을 감싸고 남북 천리를 달리는,
엔간한 철조망이나 까짓 지뢰밭쯤은
가볍게 발등으로 차 버리고 휘달리는 그런 산
2
그냥 물이어선 안돼, 그냥 그런 물이어선
스스로 등판을 찢는, 그런 피의 고통을 아는,
수천 척 직립의 벼랑을 뛰어내리는 그런 물
무수한 골짝과 골짝 그 무지와 황량을 돌아
적의의 날선 칼을 혀끝으로 다스리며
마침내 스스럼없이 만나 몸을 섞는 그런 물
그렇습니다. 조국산천은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서적입니다. 박기섭 시인은 또 다른 시조 ‘소나무 경(經)’에서 늙은 소나무는 하나의 경(經)이라 했습니다. 그 대수롭지 않은 등 굽은 나무들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산천에 깃들고 조화롭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소백, 태백, 멸악, 마천령을 휘달리던 말발굽 소리는 발해를 거쳐 광활한 대륙을 짓쳐 갔습니다. 포성에 초토화되고 벌거숭이산의 절망을 넘어 건강한 청년의 혈맥이 되었으니 이까짓 녹슨 철조망이나 흙바람에 묻힌 지뢰쯤은 한 바람 먼지에 불과합니다. 분단이며 우리들 눈앞의 사소한 갈등은 태초를 달려온 산천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아픕니다. 참고 또 참아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일어서야 합니다. 산과 강이 ‘그냥 그런 산’, ‘그냥 그런 물’이어선 안되듯 내일로 면면히 살아갈 오늘 우리도 그저 그런 사람이어선 안 됩니다. 언제나 꿈꾸고 승리하는 사람, 깃발을 꽂고 호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달균(시조시인)


